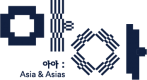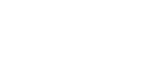아아: Asia&Asias 2025년 11호
웹진 < 아아: Asia&Asias > 2025년 11호의 주제는 한국의 서아시아·아프리카 정책 제언과 중앙아시아의 기후 변화가 가져온 이주입니다.
<아시아 브리프>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별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는 서아시아·아프리카 정책에 관한 글 두 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튀르키예의 중재 외교를 모델로 한국이 대중동 외교에 있어 중견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다자 협력을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조화림 전북대학교 교수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호해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양성+Asia>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기후변화와 영향’이라는 주제 아래에 고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가 아랄해의 소멸과 소련 시기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이 중앙아시아 환경에 초래한 문제를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