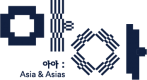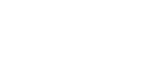아프리카를 전략적 동반자로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원, 청년 인구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경쟁의 중요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 정부도 아프리카와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재편해야 될 시기가 왔음을 시사한다. 2025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제까지의 일방향의 개발원조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대륙을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과 한국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기존 정책의 한계와 전환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은 대부분 일방향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협력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런 전략은 물론 아프리카의 빈곤 감소와 인도적 지원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원조 중심의 협력 전략은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대륙 시장에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경제 이윤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이점과 경제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미·중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접근에 반해 우리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셋째, 향후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청년 세대를 포함한 폭넓은 인적 교류가 아닌 단기 중심의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에 한계가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으로 2050년까지 아프리카 청년 인구는 전 세계 청년의 4분의 1 이상이 될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인구학적 특성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원으로 한국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아프리카 대륙을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국익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 교류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기반으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신뢰 구축의 최우선 가치임을 주목해야 한다.
기술·상생·교류 기반의 전략적 비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아프리카 협력 비전은 ‘기술과 상생’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리더 양성
현장에서의 직무 교육과 역량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청년층의 경쟁력과 관심을 높여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단발성 방문이나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인적 교류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우호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프트 파워 확산
문화·예술·스포츠 등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아프리카 사회에 확산함으로써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구축한다.
넷째,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논의
아프리카 대륙 내 청년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인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네 가지 실천 과제
앞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실행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아프리카 청년교육 프로그램 보완 및 강화
아프리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적 시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산업 수요와 한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결합한 직무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Big Data(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첨단기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즉, 결과만을 내놓는 단순한 기술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청년들 스스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아프리카 청년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체, 연구기관 및 직업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인턴십 기회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 후 실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용적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과 연계된 상생형 고용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나아가 비즈니스모델 구상과 창업을 위한 멘토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 교류 네트워크 구축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교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행해지던 단순 방문의 교류 협력에 그치기보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체험형 어학연수나 문화 체험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형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협력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보건 등 국제적 공통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공동 연구팀과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참여자의 학술 역량과 글로벌 시민 의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인재 교류와 사후 관리체계 강화
한국 청년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아프리카 현장에서의 봉사 활동, 직무체험, 스타트업 지원, 현지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외 파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은 아프리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청년들이 아프리카와의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한국의 고등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공계, 보건의료, 농업 등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교육을 제공하여 추후 양국 간 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연계하여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프리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귀국 후에도 양국 협력의 연결고리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 발전과 글로벌 협력 관련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실무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개발 모델과 경제 성장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외교의 전략화
문화·예술 교류는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는 외교 전략으로써 문화적 공감대 확장에 큰 기여를 한다. 특히 전통과 문화 소재에 현대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미해 창조해낸 결과물을 축제나 전시, 공연 등의 형태로 재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대륙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적 연대 형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외교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신뢰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은 청년 및 인적 교류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원조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지닌 청년 인구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적 지원, 교육 정책, 상생 전략이 함께한다면 양 국가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며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해당 정책 과제를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 대륙과의 외교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아프리카를 개발 협력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공동의 미래를 설계할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여 ‘사람 중심의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조화림(hwarimcho@gmail.com)
현)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국제처장, 한국아프리카학회장,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장, 한·아프리카재단 자문위원
전) 한국아프리카학회 부회장, 프랑스문화예술학회 부회장, 한국프랑스문화학회 부회장
주요 논문
- “모로코의 대아프리카 정책 아프리카의 개발 원동력 : 남남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7, 2022.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모로코 경제 현황 연구.” 『건지인문학』 31, 2021.
최신관련자료
- 김민재·김태후 (2024). “對아프리카 ODA의 방향성 및 원조 효과성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15(4), 479-493.
- 김장현 (2022). “한 · 아프리카 관계 현황과 미래 –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향해 -.” 『계간 외교』 143, 11-22.
- 유호근·설규상 (2015).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 패러다임의 변환.” 『OUGHTOPIA』 30(2), 217-245.
- 조준화 (2023). “Why South Korea is interested in Rwanda: Korean Perspectives on Good Governance.” JIAS 30(1), 93-106.
- 한유진 (2013). “아프리카 고등교육 ODA 정책방향 제안.”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8, 159-186.
- Ochieng, Haggai K., Tahira Iffat and Kim Sungsoo (2020). “Korea’s Public Diplomacy Policy towards Africa: Strategies, Instruments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Linkages with Africa.”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3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