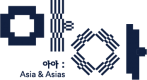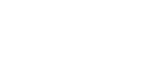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중동 지역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점진적 중동 이탈과 아랍 세계 내 반서방 정서의 확산은 기존 국제질서의 균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기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 그간 중동과의 관계를 주로 에너지 수입, 건설 수출, 노동시장 협력 등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경학적 환경은 한국이 ‘거래 기반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의 전략적 관여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와 해상 수송로의 안정성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와 같은 불안정 지역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가 중동 정세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점진적이지만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존의 진영외교 틀에 기반할 경우, 한국은 자칫 특정 세력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독자적이고 한국적인 가치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동 지역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도주의, 교육, 문화 외교 등 다층적 외교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 걸프 지역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방산·에너지·인프라 분야를 넘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연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에 주목할 만한 비교 사례로 제시된다고 본다. 에르도안 정부하의 튀르키예는 다양한 중동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서방과 이슬람 세계를 잇는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국제무대에서 ‘5대 강대국 중심 질서’를 비판하며 중견국 중심의 다자주의를 지지해 왔다. 이는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중동 전략의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중동과 동아시아 간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한-중동 협력 포럼’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자 플랫폼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이 참여하는 ‘MENA-동아시아 다이얼로그’ 같은 플랫폼은 비전통 안보, 전후 재건, 평화 교육,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견국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과 많은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나 ASEAN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자 협력의 폭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냉전기 튀르키예-이란-파키스탄이 주도한 경제협력기구(ECO)는 이러한 다자 구상의 유용한 선례다. ECO는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을 지향하며, 회원국 간 교역 촉진, 교통 인프라 연결,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안정성과 상호의존성을 증진시켜 왔다. 비록 정치적 제약으로 일정한 한계는 있었지만, ECO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간 실용적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다. 이는 한국이 구상할 수 있는 MENA–동아시아 다자협력 플랫폼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다자협력은 기존의 국제기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중견국의 집단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한국은 중견국 연대의 중심국가로서 소프트파워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역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세계는 다섯 나라보다 크다”(The world is bigger than five)라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외침은 단지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메시지를 넘어, 중견국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질서의 재편에 기여하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중동, 그리고 복합 안보 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이제 조력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은 선언적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행 가능한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MENA와 동아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간극을 메우는 ‘연결국가(linker state)’로서, 경제·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문화, 평화 교육, 지속가능 발전 등의 연성 권력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주도할 수 있다.
‘MENA–동아시아 다이얼로그’는 그 출발점이자 핵심 장치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구상하고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 중 하나다. 다양한 비전통 안보 의제와 실질적 협력 구조를 통해, 한국은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외교적 설계자로서, 지역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오종진 (jin93@hufs.ac.kr)
현) 한국외대 아시아언어문화대 학장, 한국외대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주임교수
전) 한국외대 국제교류처장, 한국외대 대외협력처장
주요 저서와 논문
- “The Emergence of Q-pop in Kazakhstan: The Glocalization of K-pop.”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14(1), 2025 (9월 예정).
- “양국 언론에 비친 한국과 튀르키예.” 『글로벌 미디어로 읽는 세계』 (공저), (초록비책공방, 2024).
- 『투르크-알타이 신흥지역의 위기와 기회: 투르크-알타이 경제문화권의 이해를 위하여』 (공저), (다해, 2023).
- “터키의 신아시아 구상과 공공외교전략.” (공저), 『중동연구』 41(1), 2022.
- “Interdependency of Business Cycle between Turkey and the Selected Central Asian Countries.” (Park et al.), Bilig(Journal of Social Sciences of the Turkic World) 81, 2017.
- “Constructing Culturally Proxmiate Space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ase of Hallyu (Korean Wave) in Turkey.” Uluslararsi Ilisikiler Akademik Dergi 10(38), 2013.
최신관련자료
- Akca, Asya. (2019) “Neo-Ottomanism: Turkey’s Foreign Policy Approach to Africa.” New Perspectiv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 Oh, Chong Jin (2023). “Role of Korea-Turkey Middle Power Cooperation in US-Russia-China Rivalry.” Istanbul Security Forum. Istanbul. May.
- Soner, Cağaptay (2020). Erdoğan’s Empire: Turkey and Politics of the Middle East. I.B Tauris.
- 오종진·김원건 (2024). “난민 거버넌스의 남북 문제와 중견국의 역할: 튀르키예 사례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45(2).
- 오종진 (2022). “튀르키예의 스윙 스테이트 전략.” 21세기평화연구소 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도전: 북핵, 미중갈등 그리고 신냉전』. 화정평화재단.
- 오종진 (2022). “에르도안 리더십과 튀르키예 대외정치 전략.”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편. 『엘리트로 보는 유라시아의 변화 1』.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