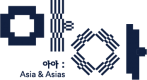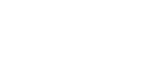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6%, 전력 수요의 3%만을 차지하며, 1인당 전력 보급률과 소비량 또한 현저히 낮다. 전력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현대 사회의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력 보급률(전력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은 53%로 세계 평균(9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전 세계 전력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소외인구는 크게 감소했으나, 동 감소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고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2010년 전 세계 전력 소외 인구의 36.8%를 차지했으나, 급격한 전력화로 2022년에는 4.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10년 49.6%에서 2022년 83.3%로 급증했으며, 전력 소외 인구수도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력 공급 소외인구 상위 20개국 중 아시아 2개국(파키스탄, 미얀마)을 제외한 18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며, 나이지리아(8,620만 명), DR콩고(7,770만 명), 에티오피아(5,500만 명)는 전 세계 전력 소외 인구의 약 1/3을 차지했다(그림 2 참조).


아프리카는 에너지 공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인도의 절반, 동남아시아의 70%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만성적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연간 GDP의 2~4%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인구 또한 2024년 약 7억 명에서 2030년에는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는 각각 60% 및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대다수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더구나 경제활동 및 가계소득 증가,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향후 에너지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원의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원 보유에 따른 개발 가속화
아프리카는 북부와 사하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일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긴 해안선과 일부 지역에서 안정적인 풍속으로 인해 풍력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는 연간 최대 24,000T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90%,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오늘날 현대적 에너지 접근이 결핍된 수억 명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지속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우수한 태양 에너지원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태양광 발전잠재력이 크다. 아프리카 대륙의 80% 이상 지역에서 태양 조사(照射) 강도가 연평균 2,119kWh/m2에 달하며, 북아프리카는 약 2,200kWh/h/m2 이상, 서부와 남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도 2,100kWh/m2 이상을 기록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력이나 풍력 자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발전 잠재력이 특히 높은 편이다(그림 3 참조). IRENA는 1%의 토지 활용률을 가정하여 아프리카에 설치 가능한 발전설비 용량을 태양에너지 7,780GW(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88, 북아프리카 2,792GW), 풍력 460GW(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7, 북아프리카 223GW)로 추정한다. 풍력의 경우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편이며 이에 따라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중으로, 모로코의 경우 2024년 기준 풍력은 전체 전력 믹스의 22%, 전체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 세계의 3% 미만에 불과하지만, 2012년 28.5GW에서 2024년 67GW로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한 나라로, 2024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48%, 풍력의 40%를 차지한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서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남아공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남아공 다음으로는 이집트. 모로코 순으로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높았으며, 태양에너지의 경우 풍력과 비교하여 3배가량 많은 국가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현재까지는 남아공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북아프리카는 신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전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약 20%, 풍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향후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수소 개발을 위한 노력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프리카는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그린 수소 허브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 8개국은(모로코, 남아공, 모리타니, 나미비아, 알제리, 케냐, 튀니지, 이집트)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향후 유럽·아시아로의 수출을 목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주요 국가별 그린 수소 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다.
남아공
남아공은 2022년 ‘남아공 수소 전략’(South African Hydrogen Strategy)과 수소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기존 HySA(Hydrogen South Africa) 전략을 구체화한 ‘그린수소 상용화 전략’(GHCS, Green Hydrogen Commercialisation Strategy)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2030년까지 전해조 용량 10GW설치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 연간 70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한다.
남아공의 대표적인 그린 수소 프로젝트는 ‘하이브 수소 코에가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Hive Hydrogen Coega Green Ammonia Project)로 남아공 코에가(Coege)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생산된 그린 수소를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프로젝트는 1,43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1,880MW급 풍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며, 응쿠라(Ngqura) 항구와 연결된 7km의 액화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통해 유럽 및 동아시아로의 수출을 위한 수출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업 운영은 2029년을 목표로 하며, 연간 50만 톤 이상의 그린 수소와 연간 10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집트
이집트는 에너지원 다각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2040년까지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5~8%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2024년 8월 ‘국가 저탄소 수소 전략’(National Low-Carbon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국내 소비용 360만 톤, 수출용 560만 톤을 그린 수소 생산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친환경 수소 인센티브법’(Law No. 2 of 2024, The Green Hydrogen Incentives Law)을 제정하여 그린 수소 생산 및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33~55%), 장비 수입 및 수소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이집트는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와 관련해 32건 이상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프레임워크 협정으로 진전된 바 있다. 대표적인 수소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초 그린 수소 프로젝트이기도 한 ‘이집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Egypt Green hydrogen Project/Egypt Green)로 노르웨이의 Scatec ASA, UAE의 Fertiglobe, 이집트의 Orascom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착공되었으며 2023년에는 이미 동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를 인도 Unilever사에 시범 선적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2027년 1단계에서는 100MW 전해조 설치, 연간 그린 수소 13,000톤, 그린 암모니아 74,000만 톤 생산, 이후 2033년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해 연간 100만~300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을 목표로 한다.
나미비아
2022년 나미비아 정부는 2050년까지 연 1,000만~1,20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 계획을 담은 ‘국가 수소 발전 전략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소 밸리’(hydrogen valleys) 구상을 제도화했다. 수소 밸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소 생산(전해조)-파생상품 생산(암모니아·비료·철강)-항만·수출’을 포함한 전 가치사슬을 한 지역에서 통합 개발하는 클러스터로, 총 3개의 수소 밸리를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미비아는 그린 수소 사업과 관련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정부 및 기업들로부터 약 1,64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과 그린 수소 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나미비아의 대표적인 수소 프로젝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인 ‘하이픈 수소 프로젝트’(Hyphen Hydrogen Project)로, 연간 20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와 연간 3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의 91%를 감축을 목표로 한다. 총 1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고 중이며, 3GW급 전해조 설비와 5GW급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연계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대륙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그린수소 동맹’(AGHA, Africa Green Hydrogen Alliance)이 있다. 2022년 5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그린 수소 글로벌 총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이집트, 케냐, 모리타니, 모로코, 나미비아, 남아공 6개국이 참여한 정부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다. 동 동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수출, 수소를 활용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중공업, 항공, 해운 등)의 탈탄소화 추진, 에너지 자립을 강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2025년 9월 기준 창립 회원국 6개국에 알제리, 앙골라 지부티,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5개국이 추가 가입해 총 11개국이 참여 중이다.
AGHA 회원국들의 청정 수소 생산 잠재력은 2050년까지 연간 3천만~6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원국 GDP의 6~12%에 해당하는 660억~1,26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공 정책, 규제, 인증, 금융, 역량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해 민간 및 공공 투자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 국제수소기구(GH2) 등과 협력하여 수소 수출 시장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MoU 체결, 타당성 조사, 파일럿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상업적 운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다. 특히 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기술은 비용 경쟁력이 낮고, 대규모 전력과 담수화 인프라의 확충이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아직 규제·법제 정비,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금융조달 구조 확립 등 제도적 기반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허브로 부상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와 기술협력,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된다면 대륙 내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김경하(kh.kim@koreaexim.go.kr)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아프리카·중동 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부문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참고문헌
AGHA(2025). “African Green Hydrogen Report.” https://ptx-hub.org/wp-content/uploads/2025/06/African-Green-Hydrogen-Report-2025.pdf?utm_source=www.hydrogen-rising.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africa-s-hydrogen-execution-gap-set-to-start-closing-by-2026
BMI(2025). “Sub-Saharan Africa Power & Renewables Report.”
GH2 Green Hydrogen Organisation. “The Africa Green Hydrogen Alliance (AGHA).” https://gh2.org/agha
IRENA(2024). “Sub-Saharan Africa Policies and Finance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4/Jul/Sub-Saharan-Africa-Policies-and-finance-for-renewable-energy-deployment
IRENA(2022).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 Africa and its Regions.” https://www.irena.org/Publications/2022/Jan/Renewable-Energy-Market-Analysis-Africa
Statista DB. “Leading Countries in Solar energy Capacity in Africa 2024 & Leading Countries in wind energy Capacity in Africa 2024.”
World Bank(2024). “World Bank Group Announces Major Initiative to Electrify Sub-Saharan Africa with Distributed Renewable Energy.”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1/09/world-bank-group-announces-major-initiative-to-electrify-sub-saharan-africawith-distributed-renewable-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