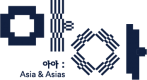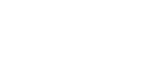시위 이틀 만에 정권이 무너졌다. 닷새째에는 임시 수상이 선출됐다.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다. 네팔의 제트 세대(1997~2022년생)가 이뤄낸 혁명이다.
근대국가의 여정 70년. 1951년에 부패한 세습 총리제를 마침내 타파한 네팔은 그 뒤로 민주주의로의 여정을 고달프게 걸어왔다. 다민족 국가로서 국민국가로의 힘겨운 전환이기도 했다. 1990년 다당제 공화정 수립, 2006년 왕정 철폐, 2015년 연방헌법 제정 등 굵직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는 수많은 시위와 희생이 있었다. 여전히 네팔은 정부 요직부터 시작해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지난 9월 8~12일 발생한 제트 세대 시위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부분은 바로 그 엄청난 속도였다. 월요일 시작돼 금요일 끝난, 어느 청년 정치인의 말마따나 ‘최고의 제트 세대 시위’였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위를 ‘승리’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2022년의 스리랑카, 2024년의 방글라데시, 2025년 8월의 인도네시아와 9월 필리핀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졌던 청년층 주도의 대규모 시위와는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시위 경위
지난 8월 말부터 정부 고위층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는 모습의 숏폼 영상이나 이미지가 네팔 젊은 층 사이에서 ‘네포베이비스(nepo babies)’, ‘네포키즈(nepo kids)’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유행했다. 그런 상황에서 9월 6일,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26개를 차단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엑스(X) 등이었다. 정부에 등록해 세금을 내고 법규를 따르라고 메타 측 등에 반복해서 요구했는데도 무시당한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
네팔 제트 세대 구성원에게 소셜미디어는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분노했다. 네포티즘(족벌주의) 비판을 막는 ‘검열’이라고 여겼다. 차단을 면한 틱톡, 바이버, 라쿠텐 등을 통해 ‘행동해야 한다!’와 같은 메시지가 급속하게 퍼졌다. 9월 8일, 수천 명이 카트만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이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 그날 총 19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는 총 74명이었다.
10대 아이들이 정부의 발포로 죽어가는 것을 수많은 중장년층 네팔인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튿날, 훨씬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다. 네팔 전역이 들끓었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전개됐다. 왕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의 정부 기관 건물, 주요 정치인의 사택이 줄줄이 공격받아 불탔다. 특히 소유주의 정경 유착 비리가 제기됐던 네팔 최대 소매 연쇄점 바트바테니(Bhat-Bhateni) 지점들과 5성급인 힐튼 호텔도 불타 무너졌다. 샤르마 올리(Sharma Oli) 총리는 사임했고 소셜미디어 차단은 해제됐다. 모두 이날 한낮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12일 금요일, 임시 총리가 선출되며 5일간의 시위가 막을 내렸다. 이 선출은 ‘디스코드(Discord)’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졌다. 이 앱에서 시위대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토론을 이어갔고, 자체적으로 임시 총리 후보를 5명 추린 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거를 시행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엄정하게 판결한 전적이 있던 수실라 까르끼(Sushila Karki) 전 대법관이 70퍼센트 이상의 득표로 임시 총리로 선출됐다.
까르끼 총리의 첫 행보는 의회 해산이었다. 시위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까르끼 총리는 6개월 뒤인 2026년 3월 5일을 총선 일자로 공지했고 그 뒤로는 권력을 놓고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시위대 일부는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도 개헌을 통해 총리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위대는 누구인가?
시위 전체를 주동한 조직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20~30대 활동가 수백 명이 시위를 이끄는 형국이었다. 이들 중에 주류 정치인은 없었다. 극우 성향의 활동가도 없었다. 네팔에는 인도의 힌두 근본주의 영향을 받아 왕정으로 회귀하자는 극우 세력도 최근 크게 불거졌다. 하지만 시위대는 왕정복고에는 무관심했다. 시위대는 극우, 친인도, 친중국, 친미국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었다. 이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서로 너무도 달랐다. 이전까지의 시위에는 대개 특정 종족(네팔은 100여 개 종족의 다민족 국가다)이 중심 세력을 형성했다. 이번에는 출신지도 다양했고 카스트와 종족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다양했다.
공통점이라면 제트 세대라는 것과 이들의 누적된 분노였다. 청년층 실업률이 20퍼센트를 웃돌았다. 양질의 일자리도 적었다. 인도, 중동, 동남아, 대한민국 등지로의 중단기 노동 이주가 거의 유일한 최선책인 분위기였다. 부정부패는 이들에게도 일상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정부는 물론 사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쌓인 울분도 많았다. ‘네팔은 가난하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진 ‘환상’이었고, 네팔 주민에게는 ‘강요된 환상’이었다. 네팔 정부가 총부리를 자국민에게 겨눈 사건은 10여 년마다 한 번꼴로 발생했다. 1996~2006년의 시민전쟁 시기에는 17,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구조적 폭력과 차별은 매일 벌어졌다. 불가촉천민 달리트(Dalit) 구성원이 받는 차별은 차마 눈 뜨고 보기가 어렵다. 전국에서 보고되는 강간 범죄만 하루 평균 7차례에 이른다. 시민전쟁 당시 사망자들의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으나 듣는 이가 없다. 시위는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된 울분의 표출이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의 정치, 휘발된 다양성
이번 시위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저항한 시민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다수 네팔인이 그 결말에 전율했고 또 안도했다.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네팔 내외의 적지 않은 지식인이 이 ‘혁명’을 두고 낙관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럿 벌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혐오다. 이 시위는 그간 네팔에서 벌어진 수십 차례의 대규모 시위 중에 유일하게 정당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시위였다. 정당들은 오히려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당은 좋건 싫건 대의민주주의의 필수 장치다. 정당정치를 우회하고 폭력에 의한 권력 쟁취가 현실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유된 신념 자체를 흔드는 사건일 수 있다.
둘째, 시위의 전례 없는 폭력성이다. 시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격했다. 경찰 3명이 시위대의 구타로 사망했다. 왕궁, 국회의사당, 대법원이 불타 무너졌다. 마트, 학교, 호텔, 신문사 건물도 불탔다.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전체 재산 피해는 네팔 GDP의 1.5배에 달했다. 다만 이 모든 폭력이 시위대 본류인 제트 세대 구성원들이 저지른 일인지는 분명치 않다.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한 화요일 오전, 경찰력이 증발하면서 동시에 네팔 전역 25개 교도소에서 수감자 15,000여 명이 탈옥했다. 약탈이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탈옥자들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주동자들은 폭력 행위가 시위대의 소행이 아니라고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로 알리기도 했다. 놀라운 점은, 그런 서로 이질적인 폭력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 냈고, 그게 시위 ‘성공’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새로운 체제의 위헌성이다. 디스코드에서의 온라인 토론은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되는 숙의민주주의 양상을 보였으나, 그들은 활동가였을 뿐 누구도 대표하지 않았다. 임시 총리 온라인 선거의 참여자 중에 재외국민은 적지 않았는데, 네팔은 여태껏 한 번도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헌법 개정을 위해 비헌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모순은 장차 화근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시위 뒤에 숨겨진 의혹들이다. 시위대 배후에 인도가 있었나? 아니면 하야했으나 아직 건재한 게넨드라(Gyanendra) 왕이 어떤 역할을 맡았던가? 메타가 네팔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데에는 미국 정부의 영향이 있었던가? 네팔은 약소국이지만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군은 왜 총리가 사임하기 전까지도 출동하지 않았던가? 신변 위협을 느낀 정당 대표들이 군부대로 찾아가 은거했던 이유는? 군부의 속셈은 무엇이었나? 군부가 여전히 쿠데타 가능성을 엿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다섯째, 여전히 비협조적인 기존 주류 정치인들의 존재다. 까르끼 총리의 의회 해산 결정을 당대표들은 모두 반대했다. 당 내부의 비민주성을 쇄신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여전히 권력을 쥔 정치인들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였다. 내년 3월의 총선에서, 일부 청년만이 아닌 네팔 전체의 민심은 이들을 과연 심판할 것인가?
‘부패’에 대항한 전면전은 승리했다. 그러나 이 승리를 민주주의 정착을 향한 ‘진전’이라고 여길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확인된 것은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힘이다. 권력이란 다양성을 휘발시키고 하나로 결집한다는 속성을 이번 네팔 시위는 유감없이 보여줬다. 가려져 드러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다양성이다. 권력이 되기 이전의, 권력의 부재로 인해 구조적 폭력의 먹잇감이 되었던 다양성의 현실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다.
저자 소개
오영훈(young50@snu.ac.kr)
현) 경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계약 교수,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 연구원.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리버사이드 캠퍼스 인류학 강사
<주요 저서와 논문>
“기록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의 공유재적 특성: 트란스크리부스를 이용한 한국산악회 코퍼스 구축 사례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8(1), 2025.
“Sherpa’s Mountain and Expedition Conglomerate.” In Other Everests: One mountain many world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24).
“종족성의 일상적 실천: 히말라야 등반과 네팔 셰르파 종족집단의 사례.” 『남아시아연구』 29(3), 2023.
『셰르파, 히말라야 등반가: 인류학으로 읽는 셰르파 이야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
“Dying Differently: Sherpa and Korean Mountaineers on Everest.” Minnesota Review 90, 2019.
<최신관련자료>
Adhikari, Krishna P. and David N. Gellner (2025). “Gen-Z and Nepal’s Ongoing Struggle for Change.” The India Forum, September 22. (accessed 2025, Oct. 13)
https://www.theindiaforum.in
Gellner, David A. and Adhikari, Krishna P. (2024). Nepal’s Dalits in Transtion. Kathmandu: Vajra Publications.
Rana, Pranaya (2025). “Nepal’s staggering journey from Gen Z protests to new government.” Himal Southasian. September 13. (accessed 2025, Oct. 13)
https://www.himal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