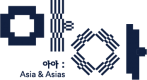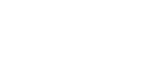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비교사의 모험’, 유학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만들었는가? – 와타나베 히로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을 읽고
『역사학보』 262권
저자: 김호(아시아연구소 HK교수)
조선과 일본의 유학은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
이 글은 와타나베 히로시의 저서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과 방법론에 대한 비평 논문이다. 와타나베는 일본 정치사상사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과거와 주변과의 ‘비교’를 강조한다. 그가 분석한, 에도 일본의 권력은 폭력에 의한 지배, 즉 ‘어위광’의 정치였다. 평화시기를 누렸던 에도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무위(武威)는 위압적인 이미지와 이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엄숙한 의례를 통해 유지되었다. 어위광의 에도에서 유학은 독특한 형태로 뿌리내렸는데, 이는 후일 일본주의[국학]를 형성하거나, 서구를 배우려는 메이지의 개화를 추동하는 배경이 되었다. 천황 복권의 흐름도 만들어 냈다. 유학은 에도 일본의 주류 사상이 될 수 없었지만, 뜻밖의 영향을 남겼던 것이다. 한편 ‘리의 나라’ 조선은 일본과는 전연 다른 역사적 궤적을 형성했다. 조선에서 유학은 정치와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리의 보편성’은 자의적인 통치 권력을 제어하거나 만인의 군자화를 가능케 했다. ‘누구나 君子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군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성리학의 이상이 조선의 현실에서 빚어낸 다양한 역사상, 그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