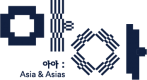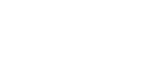기후위기와 재난감각의 상시화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에 상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 감각 자체가 이제 재난을 예외적인 상태가 아닌 상시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폭염과 관련된 전 세계 기온의 상승 수치는 현재의 폭염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매체에서는 해수의 온도상승과 해류와 기압골의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세계인들에게 누적되면서 과거에는 운명론적 태도로 운이 없어서 재난을 당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아무리 재난을 피하고자 해도 모두가 쉽지 않다는 감각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테면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나도 우리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편재하는 재난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재난의 계급적 불평등이 물론 명백히 존재하지만, 지금의 기후재난은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오래전 『위험사회』에서 말했던,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란 표현은,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재난이 민주화되고 일상화된 현시기에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초국적 기후재난과 동북아시아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재난 감각과 더불어, 단일 민족국가 차원에서 지금의 기후재난들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듯하다. 기후재난은 민족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과거에도 동북아시아의 자연재난은 초국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럭저럭 각 국가가 알아서 대처했다면, 지금은 그 발생과 대처 모두에서 초국적 사고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만일 초국가적 사고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동북아시아 공동기후재난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례로 2020년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집중호우는 동북아시아 공동기후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월 말, 6월 초부터 중국 창장(長江) 일대 등 중국 중남부 일대 강타한 비구름 중 일부가 7월 초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 규슈 지방에 집중호우를 뿌렸으며, 심지어 이는 레이와 2년 7월 호우(令和2年7月豪雨 れいわにねんしちがつごうう)라고 명명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7월 중순쯤, 이 비구름 일부가 한반도로 이동했고, 한반도 남부 지역 등에 한반도 폭우사태로 불렸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한국의 경우, ‘강남역’이 침수된 사진으로 이때의 폭우는 주로 기억될 것인데, 이는 재난 기억조차 수도권 집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인명피해와 건축물 붕괴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가 공동기후재난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난의 공동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시아가 개별 민족국가로 성립되어 있으나, 적어도 재난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사회(a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동북아시아가 민족국가의 개별성을 넘어서 ‘환경안보’의 시각에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24년 5월 26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시에 환경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각국의 에너지 생산과 오염물 이동(황사, 플라스틱 등) 문제만을 다루었을 뿐이다(이태동, 2024/5/29). 결국 수자원 분야의 협력만을 기약하고, 세 나라 간의 기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이태동, 2024/5/29). 기후위기를 의제로 제시하지만 에너지 문제, 오염물질 유입 방지 문제 등 성장주의적 의제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양새가 엿보인다.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난을 이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일상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재난의 일상성은 재난과 재난 이후의 시간이 예외적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 시간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야기한 사회적 삶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때 그동안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커먼즈(commons)의 논의를 동북아 스케일로 확장하는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래에는 커먼즈를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공동체로 한정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권리라든가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 확보가 국지적으로는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커먼즈의 규모와 확장 전략”이 요구되기 시작했다(홍덕화, 2022). 따라서 커먼즈도 지역정부나 중앙정부, 나아가 지역공동체 등 공공부문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시아 공동기후재난은 재난이 지역과 사회를 연결한다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커먼즈의 ‘확장’ 전략과 접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재난 이후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커먼즈 확장이라는 전략과 만날 수 있다. 재난 발생시 행정적인 대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난 이후 상처 입은 공동체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난사회라는 인식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별도의 영토국가가 아닌, 공공적 협력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재난 대응의 제도화와 나라별 차이
분명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지금도 동북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대형재난과 참사가 수시로 발생한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법령과 제도가 생겨났다. 한국의 경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이후 국가-사회 간 협력의 중요성이 논해졌으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가 정책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역사가 깊은데, 1959년 이세완 태풍의 영향으로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이 수립되었으며,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국가-사회 재난대응 체계가 고도화되었다. 중국은 1976년 탕산대지진, 2008년 원촨대지진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기초로 기업, 비정부기구, 개인이 참여하는 재난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했다.
재난 양상과 대응의 변동을 살피려면 동북아 국가들의 재난 대처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은 지역 중심 재난 해결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마비되었고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사기업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재난을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동일본대지진 부흥 기본법’을 제정하고 ‘부흥청’을 설치하였다. 부흥청은 지방과의 일원화된 소통 창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국가 주도로 재난 이후를 만들어 가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폐허가 된 동일본과 후쿠시마의 재난 지역에 전쟁 이후의 재건과 유사한 거대자본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지역민의 사회적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임면권, 재정과 자원 분배권, 주요 프로젝트 승인권을 통해 하급 정부를 통제한다. 대신 세금 배분에 있어 중앙이 책임성을 갖고 부유한 지방이 그렇지 않은 지방에 세수를 배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지방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 또한 전쟁 서사를 통한 사회동원이 여전히 작동하는데, 항일 구국, 항미원조 등의 역사적 상징이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 코로나19, 사스, 폭설, 가뭄 재해 등에 대항하는 재난 레토릭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처와 판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수재는 2020년 8월 베이징 폭우, 2021년 7월 20일의 허난성 정저우 폭우, 2023년 베이징-톈진-허베이 수해인데, 대중의 관심도와 재해의 심각성이 항상 비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후난성 수해에서 화롱현은 둥팅호 제방 붕괴로 여러 차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사실 주목받지 못한 핑장현의 재해 피해가 화롱의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인력, 재정 지원이 화롱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와 여론에 의해 구성된 위급성 정도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사회참여형 거버넌스’ 같은 기층과의 상호해결을 지향하는 방식으로의 거버넌스 전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재난 거버넌스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1].
동북아 기후위기 협력의 현재
기존에 동북아시아의 기후협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아 기후협력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현재의 환경오염을 감축시키는, 즉 온실가스(CO2 배출량)를 줄이는 것인데, 시장중심적 해결책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신상범, 2016). 일본은 탄소세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소세 정책이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2].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배출권거래제를 각각 2015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발 중심의 고도성장 노선을 갖고 있는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 시장기반의 기후위기 대처를 가장 선호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CO2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주요 탄소 감축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과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워낙 높다보니, 동북아시아가 근미래에 탄소거래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도 높다. 만일 한중일이 통합된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배출에 관하여 투명한 정보의 상호 측정, 보고, 검증 절차를 공유하는 MRV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록 시장기반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기후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신상범, 2016).
그러나 이러한 시장 기반적 기후협력만으로는 재난 ‘이후’의 사회를 회복하고 만들기 어렵다. 특히 탄소 감축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저지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과 그 이후의 문제에도 대처하는 협력 방안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커먼즈의 확장이 중시될수록 국가나 공공부문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커먼즈는 애초에는 정부나 시장과 독립된 별도의 공동체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던 논의이기 때문에, 커먼즈의 확장은 결국 확장과정에 정부나 공공기관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적어도 재난의 문제는 지역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동북아 기후재난 공동체의 모색
동북아시아의 기후재난에 대한 협력을 말하기에는 동아시아 내 상호인식의 이질성과 심지어 적대성이 존재하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한때 활발했던 동아시아 담론도 최근 동아시아의 정치적 문화적 긴장 속에서 소강상태인 듯하다(김경호, 2023: 391).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자연환경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웃의 재난이 바로 옆의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적어도 피해방지라는 매우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라도 기후재난의 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들을 위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를 끌어낼 수 있다.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사안들과는 달리, 재난의 문제는 공동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담론도 이제는 자연생태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사고해야 할 것이다(김경호, 2023). 학계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충격으로 ‘재난인문학’을 모색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강희숙, 2020). 특히 재난이 일상화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재난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재난문학이 어느 정도 제도화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김영근, 2022).
물론 기후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고 대처해야 하지만, 그 출발은 지역 국가 간 협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상호적 다자주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은 민간의 교류인 학술교류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실 기후위기 관련 학술교류조차 현재 시작 단계다. 2023년 이전까지 한국, 일본, 중국의 과학자들은 기상학 분야에서는 협력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그 영향, 그리고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한 공식적인 플랫폼은 여전히 부족했다.

출처: 아시아연구소
세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이른바 “미래의 지구(Future Earth)”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NRF), 일본학술진흥회(JSPS),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가 후원하는 “동북아시아 Future Earth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허브 네트워킹” 공동 프로젝트가 2023년에 승인되어, 2023년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바 있다(Yuan et al., 2024). 이 공동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연구 정보 교환, 협력 연구 촉진, 정기 워크숍 개최, 그리고 초기 경력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동 아시아 허브를 설립하는 것으로, 모두 동북아시아에서 Future Earth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숍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Future Earth 전략: 과학 연구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까지”였으며,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다: “동북아시아의 기후변화: 과거에서 미래까지”, “변화하는 기후에서의 아시아 몬순과 극한 기상현상”, “기후-에어로졸 상호작용과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시아의 생태계와 사회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발표들이 주로 자연과학적 논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워크숍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도 조직했다. 특히 세 국가의 연구자들은 모두 더 심층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장기적 교류를 위한 새로운 세대 양성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세 국가의 젊은 과학자들이 이끄는 네 개의 작업 그룹(WG)도 설립되었다[3].
글로벌 차원에서는 UN이 비록 효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기후위기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정착시켜 왔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기후재난에 대해서만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식적인 협의, 협력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ASEAN이나 동아시아정상회의 협의체들을 기반으로 할 필요도 있다. 커먼즈의 확장 전략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움직임과 결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확장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몇몇 나라가 주도하는 ‘의지의 동맹(coalitions of willing)’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앤서니 기든스, 2009). 기후재난은 국경과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이를테면 다음 연구가 한중일 3국의 재난 거버넌스의 차이뿐 아니라 유사성을 탐구하고 있다. 김영근, 2022, “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 인간의 안전보장과 생명정치의 기원”, 「일본연구」 제37집, pp.352-353.
[2]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탄소배출국이다.
[3]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WG들은 세 국가의 과학자들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교류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며, 논문 작성과 학생 공동 지도와 같은 협력 활동을 조직하거나,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다(Yuan et al., 2024).
저자소개
김란(jinlan8080@naver.com)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과 중국의 가족, 청년과 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시각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에서 동북아시아의 재난과 수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재난의 의미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최근 논저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모성 실천: 내권적 마더링의 형성(2023)」, 「중국의 ‘분투’ 문화를 통한 청년 통치성 – 선전시 분투자광장(奮鬪者廣場)을 중심으로(202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청년의 脫호명 정치: 후랑(後浪) 현상과 따공런(打工人) 정체성을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
참고문헌
강희숙, 2020, “동아시아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모색”, 「인문학연구」 제59집, pp.9-32.
김경호, 2023, “21세기 동아시아를 넘어선 동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모색: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사림」 제86호, pp.375-404.
김영근, 2022, “동아시아 재해 거버넌스: 인간의 안전보장과 생명정치의 기원”, 「일본연구」 제37집, pp.347-372.
신상범, 2016, “The Market Incentive Climate Change Policies in Northeast Asia”, New Asia, Vol.24, No.1, pp.74-104.
앤서니 기든스,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홍덕화, 2022, “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ECO」 26권 1호, pp.179-219.
이태동, 2024.5.29., “환경안보와 한일중 협력: 정상회의의 함의와 향후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2512&board=kor_issuebriefing
Naiming Yuan, Kyung-Ja Ha, Masahiro Watanabe, Tianjun Zhou, Wenjie Dong, 2024, “Future Earth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From Scientific Research to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Boston: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105(11), pp.E2064-E2069.